입력 : 2018.04.25 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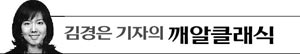
지난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첼리스트 지안 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공연. 까만 옷을 입은 여성이 김선욱을 따라나와 옆에 앉았다. '페이지 터너(Page Turner)', 글자 그대로 '쪽(악보) 넘기는 사람'이다.
연주가 끝난 뒤 공연장은 청중의 박수로 차올랐다. 지안 왕과 김선욱이 서로 얼싸안았다. 하지만 두 시간 내내 악보를 넘긴 페이지 터너는 돌부처처럼 앞만 바라봤다. 박수는 그의 몫이 아니었다.
악보를 넘기는 '손'. 음악계에서는 페이지 터너를 '넘돌이' 혹은 '넘순이'란 애칭으로 부른다. 있는 듯 없는 듯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날의 연주를 좌우할 수도 있다. 악보를 제때 못 넘기거나, 두 장을 한꺼번에 넘기거나, 악보를 넘기다 연주자의 시야를 가리면 연주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피아니스트 유자 왕이 손발 안 맞는 넘순이를 만나 그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영상은 유명하다.
연주가 끝난 뒤 공연장은 청중의 박수로 차올랐다. 지안 왕과 김선욱이 서로 얼싸안았다. 하지만 두 시간 내내 악보를 넘긴 페이지 터너는 돌부처처럼 앞만 바라봤다. 박수는 그의 몫이 아니었다.
악보를 넘기는 '손'. 음악계에서는 페이지 터너를 '넘돌이' 혹은 '넘순이'란 애칭으로 부른다. 있는 듯 없는 듯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날의 연주를 좌우할 수도 있다. 악보를 제때 못 넘기거나, 두 장을 한꺼번에 넘기거나, 악보를 넘기다 연주자의 시야를 가리면 연주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피아니스트 유자 왕이 손발 안 맞는 넘순이를 만나 그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영상은 유명하다.

아무나 넘돌이, 넘순이가 될 수도 없다. 뭣보다 악보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음대생, 특히 피아노 전공생이 많다. 악보의 한두 마디 정도를 남기고 피아니스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재빨리 넘기는 게 요령. 페이지 터너를 고를 때 '긴 팔'을 중시하는 연주자도 있다. 팔이 길어야 연주자와 거리를 두고 앉아도 악보 넘기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짧은 치마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금물. 1회에 5만~10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는다.
요즘은 태블릿 PC에 악보를 넣어 혼자 넘기는 연주자도 있다. 그러나 페이지 터너가 여전히 많은 걸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몸짓만큼 이상적인 궁합은 없나 보다. 공연이 끝난 뒤 연주자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페이지 터너에게도 박수를 보내주면 어떨까.
요즘은 태블릿 PC에 악보를 넣어 혼자 넘기는 연주자도 있다. 그러나 페이지 터너가 여전히 많은 걸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몸짓만큼 이상적인 궁합은 없나 보다. 공연이 끝난 뒤 연주자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페이지 터너에게도 박수를 보내주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