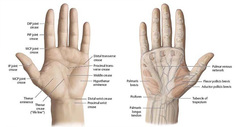입력 : 2018.03.04 23:56
[3월의 눈]
곧 뜯겨 나갈 한옥 피란민 노부부 거친 세월 버텨낸 삶 이야기 담아
시적 대사 꾸밈없는 연극의 힘… 명동예술극장서 매진 행렬
무대 위엔 팔아버린 한옥의 곧 뜯겨 나갈 대청마루와 그 뒤 앙상한 나무가 전부. 배우들은 초봄에 내리는 눈이 된 양 느릿느릿 움직이고 말한다.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3월의 눈'(연출 손진책)은 채우기보다 비우고, 소리 높이기보다 오래 침묵한다. 이 요즘 보기 드문 연극에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관객 성원이 땅에 닿아도 녹지 않는 눈처럼 단단하다.
"그때 영감이 똑 준치 생선 같았수. 그냥 살겠다구, 온몸에 가시가 돋쳐가지구서는." 익숙한 것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오래된 동네, 남편 장오를 보며 아내 이순이 말한다. 북한 출신 피란민 부부는 고된 세월을 함께 살아냈다. 하나뿐인 아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했고, 손자 세대는 살아남느라 허덕였다. 손자 빚 가려주느라 팔아치운 한옥집, 아내는 미닫이문 창호지를 새로 바르자며 떼를 쓴다. 문종이를 바르며 오가는 부부의 대화에 근현대사 거친 세파를 온몸으로 버텨낸 보통 사람들 이야기가 점점이 스며든다. 연출가 손진책은 "되도록 느리고 조용한 연극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 뜻대로 이 연극의 호흡은 섬세하고 부드럽다. 날이 저물고 밝는 걸 표현하는 조명과 내리는 눈까지 그렇다.
"그때 영감이 똑 준치 생선 같았수. 그냥 살겠다구, 온몸에 가시가 돋쳐가지구서는." 익숙한 것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오래된 동네, 남편 장오를 보며 아내 이순이 말한다. 북한 출신 피란민 부부는 고된 세월을 함께 살아냈다. 하나뿐인 아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했고, 손자 세대는 살아남느라 허덕였다. 손자 빚 가려주느라 팔아치운 한옥집, 아내는 미닫이문 창호지를 새로 바르자며 떼를 쓴다. 문종이를 바르며 오가는 부부의 대화에 근현대사 거친 세파를 온몸으로 버텨낸 보통 사람들 이야기가 점점이 스며든다. 연출가 손진책은 "되도록 느리고 조용한 연극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 뜻대로 이 연극의 호흡은 섬세하고 부드럽다. 날이 저물고 밝는 걸 표현하는 조명과 내리는 눈까지 그렇다.

극작가 배삼식의 대사는 운율 있는 민요 같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두고 '그런 빨갱이 자식 둔 적 없다'고 절규하던 장오가 혼잣말을 한다. "그려, 자네 말대로 착한 놈이라/ 죄 없는 놈이라/ 눈 녹듯이 간 걸 게여/ 꽃 지듯이 간 걸 게여." 이순은 마룻장 뜯어낸 자리에 가만히 누운 말 못 하는 노숙인을 보며 말한다. "자네 넋은 어디 두고/ 몸만 남았는가/ 나는 집을 잃었구/ 자네는 집만 남았는가…."
연극의 클라이맥스, 한옥이 해체되는 날 새벽 아내 이순이 양로원으로 떠나는 남편 장오에게 한쪽 팔 덜 뜬 털실 카디건을 입힌다. 말없이 남편을 안을 때 3월의 눈이 내린다. 떠나는 이는 남편인데 아내가 말한다. "당신은 천천히, 천천히 와요…." 관객은 이미 그 이유를 알아차린 뒤다. 그 말이 더 가슴을 저민다. 격한 갈등이나 반전도 없는 이 무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은, 역시 남편과 아내 역을 맡은 배우 오현경·오영수, 손숙·정영숙의 힘이 크다. 손잡이를 잡고 대청에 오르거나 굽은 등허리를 한옥 기둥에 기대는 디테일로 마음에 새겨지는 미세한 결을 표현한다. 이 관록의 배우들 연기는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다.
결국 모두 떠난 집을 인부들이 요란스레 뜯어낸다. 하지만 세월 먹고 반들반들해진 마룻장이며 문틀은 이제 곧 찻상이 되고 밥상도 돼 다시 살아갈 것이다. 이 연극은 조금씩 사위어가는 것에 대해 낮은 소리로 말한다. 관객 가슴에 대고 '그러니 당신 인생은 어떻게 사라져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어느 때보다 연극을 아끼는 이들의 근심이 깊다. 바깥은 소란스러우나 연극 '3월의 눈'은 고요하다. 무대는 비울수록 차오르고, 꽉 찬 객석엔 눈물 흘리는 관객이 있다. 결국 좋은 배우가 선 곳이 좋은 무대다. 그 무대에 기립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여전하다. '3월의 눈'은 허물어져가는 집과 사람의 역설적 힘으로 연극이 꿋꿋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무대다. 공연은 11일까지.
연극의 클라이맥스, 한옥이 해체되는 날 새벽 아내 이순이 양로원으로 떠나는 남편 장오에게 한쪽 팔 덜 뜬 털실 카디건을 입힌다. 말없이 남편을 안을 때 3월의 눈이 내린다. 떠나는 이는 남편인데 아내가 말한다. "당신은 천천히, 천천히 와요…." 관객은 이미 그 이유를 알아차린 뒤다. 그 말이 더 가슴을 저민다. 격한 갈등이나 반전도 없는 이 무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은, 역시 남편과 아내 역을 맡은 배우 오현경·오영수, 손숙·정영숙의 힘이 크다. 손잡이를 잡고 대청에 오르거나 굽은 등허리를 한옥 기둥에 기대는 디테일로 마음에 새겨지는 미세한 결을 표현한다. 이 관록의 배우들 연기는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다.
결국 모두 떠난 집을 인부들이 요란스레 뜯어낸다. 하지만 세월 먹고 반들반들해진 마룻장이며 문틀은 이제 곧 찻상이 되고 밥상도 돼 다시 살아갈 것이다. 이 연극은 조금씩 사위어가는 것에 대해 낮은 소리로 말한다. 관객 가슴에 대고 '그러니 당신 인생은 어떻게 사라져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어느 때보다 연극을 아끼는 이들의 근심이 깊다. 바깥은 소란스러우나 연극 '3월의 눈'은 고요하다. 무대는 비울수록 차오르고, 꽉 찬 객석엔 눈물 흘리는 관객이 있다. 결국 좋은 배우가 선 곳이 좋은 무대다. 그 무대에 기립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여전하다. '3월의 눈'은 허물어져가는 집과 사람의 역설적 힘으로 연극이 꿋꿋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무대다. 공연은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