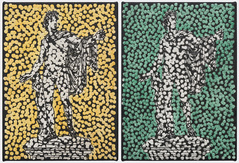입력 : 2013.04.11 03:05
| 수정 : 2013.04.12 10:32
[22년 만에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된 고수 김청만]
안숙선·이매방이 '사랑한 남자'
"국립국악원 응시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 줄줄이 포기
'한방에 통하는 소리' 一通이 號 전화국에서 달라고 귀찮게해"
"테레비에 안 나오니 알간디?"
중요무형문화재 된 걸 축하하자 고수(鼓手) 김청만(67)이 시큰둥해했다. "공연 끝나도 죄다 소리꾼한테 몰려가고 북 치느라 수고했다는 사람은 없으니 얼른 짐 싸서 돌아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지요."
말은 그렇게 해도 후보자 된 뒤 22년 만의 경사라 김청만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안숙선, 오정숙, 박동진, 이매방 등 명창·명무들이 사랑했던 남자다. "장단 없는 음악 없잖아요? 제아무리 명창이어도 고수가 제 역할 못하면 흥이 빠져요. 박동진 선생한테 장단 하나 딱딱 못 맞춘다고 '이 씨버글놈아' 욕먹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1고수 2명창'이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중요무형문화재 된 걸 축하하자 고수(鼓手) 김청만(67)이 시큰둥해했다. "공연 끝나도 죄다 소리꾼한테 몰려가고 북 치느라 수고했다는 사람은 없으니 얼른 짐 싸서 돌아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지요."
말은 그렇게 해도 후보자 된 뒤 22년 만의 경사라 김청만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안숙선, 오정숙, 박동진, 이매방 등 명창·명무들이 사랑했던 남자다. "장단 없는 음악 없잖아요? 제아무리 명창이어도 고수가 제 역할 못하면 흥이 빠져요. 박동진 선생한테 장단 하나 딱딱 못 맞춘다고 '이 씨버글놈아' 욕먹은 고수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1고수 2명창'이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김청만에겐 팬클럽이 있다. 호가 '일통(一通)'이라 '일통고우회'다. "한학자 송정희 선생이 지어주셨어요. 당대에 북을 제일 잘 치는 사람 되라고. '한방에 통하는 소리'란 뜻이니, 전화국에서 그 호 좀 팔면 안 되겠냐고 엄청 못살게 굽디다(웃음)."
목포 출신 김청만은 13세 때부터 설장고를 쳤다. 부농(富農)인 아버지는 장남이 농악대 쫓아다니는 걸 반대했지만, 유달국악원에서 농악이라도 보고 온 날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장고'를 두드렸다. 우유깡통 2개를 이어붙여 만든 장고였다. 김이삼 단장이 이끄는 '123악극단'에 발탁돼 '천재소년 설장고'란 이름으로 전라도 일대를 누볐다. "쬐끄만 게 장고 잘 친다고 연기자들이 '오매~ 내 새끼'를 입에 달고 살았"다.
당대 최고였던 임춘앵 여성국극단에 장고 주자로 '스카우트'되면서 열여덟 살 김청만은 청운의 꿈을 품었다. "횃불 공연이 아니라 정식으로 '전구다마' 달린 조명 아래서 연주를 하니 가슴이 얼얼합디다." 하지만 꿈에 닿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군대 다녀왔더니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가설무대를 떠돌다 서울로 올라왔지요. 대금 부는 원장현, 가야금 하는 백인영, 나 셋이서 3만원짜리 사글셋방을 얻어놓고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입니다."
한일섭(북·아쟁), 김동준(고법)을 사사한 뒤 1981년 국립창극단 타악주자로 들어갔다. 거기서 안숙선, 김영자, 김수연, 김일구, 조통달 등 당대 소리꾼들을 만났다. 국립국악원에 들어가려고 시험 보러 간 날엔, 김청만이 시험 본다는 소문에 다른 지원자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만큼 북 치는 솜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판소리, 병창, 경기민요, 무용, 산조까지 민속기를 두루 다뤄가며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라도 말로 '늘푼수'가 없는 거지. 요즘 젊은 국악인들은 한 가지 악기만 파고드는데, 그러면 못써요."
최고 명창으로 안숙선을 꼽지만 고수로서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춘 오정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명고수 되는 비결은 '추임새'에 있다고 했다. "소리꾼의 장단이 느려지면 당겨주고, 빨라지면 늦춰주는 게 추임새죠. 고수가 얼마나 신명나고 정확하게 추임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소리꾼이 제 실력을 발휘한다고요. 무대 뒷전 인생, 그래서 할 만했지요."
목포 출신 김청만은 13세 때부터 설장고를 쳤다. 부농(富農)인 아버지는 장남이 농악대 쫓아다니는 걸 반대했지만, 유달국악원에서 농악이라도 보고 온 날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장고'를 두드렸다. 우유깡통 2개를 이어붙여 만든 장고였다. 김이삼 단장이 이끄는 '123악극단'에 발탁돼 '천재소년 설장고'란 이름으로 전라도 일대를 누볐다. "쬐끄만 게 장고 잘 친다고 연기자들이 '오매~ 내 새끼'를 입에 달고 살았"다.
당대 최고였던 임춘앵 여성국극단에 장고 주자로 '스카우트'되면서 열여덟 살 김청만은 청운의 꿈을 품었다. "횃불 공연이 아니라 정식으로 '전구다마' 달린 조명 아래서 연주를 하니 가슴이 얼얼합디다." 하지만 꿈에 닿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군대 다녀왔더니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가설무대를 떠돌다 서울로 올라왔지요. 대금 부는 원장현, 가야금 하는 백인영, 나 셋이서 3만원짜리 사글셋방을 얻어놓고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입니다."
한일섭(북·아쟁), 김동준(고법)을 사사한 뒤 1981년 국립창극단 타악주자로 들어갔다. 거기서 안숙선, 김영자, 김수연, 김일구, 조통달 등 당대 소리꾼들을 만났다. 국립국악원에 들어가려고 시험 보러 간 날엔, 김청만이 시험 본다는 소문에 다른 지원자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만큼 북 치는 솜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판소리, 병창, 경기민요, 무용, 산조까지 민속기를 두루 다뤄가며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라도 말로 '늘푼수'가 없는 거지. 요즘 젊은 국악인들은 한 가지 악기만 파고드는데, 그러면 못써요."
최고 명창으로 안숙선을 꼽지만 고수로서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춘 오정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명고수 되는 비결은 '추임새'에 있다고 했다. "소리꾼의 장단이 느려지면 당겨주고, 빨라지면 늦춰주는 게 추임새죠. 고수가 얼마나 신명나고 정확하게 추임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소리꾼이 제 실력을 발휘한다고요. 무대 뒷전 인생, 그래서 할 만했지요."
♣ 바로잡습니다
▲11일자 A22면 '22년 만에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된 고수 김청만' 기사에서 '원장연'은 '원장현'으로 바로잡습니다
▲11일자 A22면 '22년 만에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된 고수 김청만' 기사에서 '원장연'은 '원장현'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