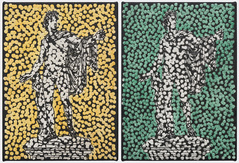"무용극 하나 보러 갈래? 부처님 이야긴데…" "기독교도라서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용을 보러 가자고 해도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를 소재로 했다고 하니 동반자를 구하기 더 어려웠다. 종교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불교라는 단어가 주는 지루함, 전통예술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부처의 삶은 안무의 역동성과 강렬한 무대 연출로 그런 걱정을 새털처럼 가볍게 날려버렸다.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극장 용에서는 파사무용단(예술감독 황미숙) 10주년 특별기획공연 '붓다, 일곱걸음의 꽃'의 초연이 펼쳐졌다. 평소 무용을 즐기는 것도 아니었고 종교를 소재로 했다니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무대를 지켜봤다.
우선 익숙한 이야기와 강렬한 안무가 눈을 사로잡는다. 대사가 없는 'non-verbal' 극인 무용극은 공연 시작 전 팜플릿이나 스크린을 통해 문자로 줄거리를 익혀야 한다. 아무리 멋진 안무도 내용을 모르면 뜻을 찾기 어렵다. 붓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강점이 있다. 동양인이라면 한 번쯤은 보고 들었을 만큼 널리 알려진 붓다의 삶을 무대에 표현한 것이고 불교 예술의 표현양식 또한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어 의상부터 안무까지 낯설지가 않다.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춤사위는 생경하다. 현대무용을 언어로 삼아 몸 전체를 체조선수처럼 쓰는탓에 긴장감이 손끝, 발끝까지 팽팽하다. 10명 이상이 단체로 연기를 펼칠 때는 서커스나 댄스 스포츠에서나 나올법한 곡예가 난무한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마왕 파순의 온갖 유혹을 견디는 하일라이트는 파사무용단의 수준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막힌 장면의 연속이다. ‘전통은 정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산산이 부시는 영화 같은 연출은 점잖은 관객들의 호흡마저 빼앗았다.
붓다를 연기한 최원석은 훤칠한 키와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시원한 춤사위가 일품이다. 긴팔과 다리를 이용한 동작 하나하나는 붓다의 우아함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붓다 외에 눈에 띄는 캐릭터가 없는 상황에서 캐스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초연이라 시작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군무를 할 때 동선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아 아쉬움은 있었다. 그렇지만, 안무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하는 댄서들의 모습에서 불심(佛心)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무대였다. 공연을 기획한 Lim-AMC 관계자는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 관객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완벽한 공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수PD absdizz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