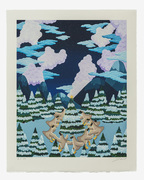"27년 간 국악기 제작 외길" 예혼국악기 김관영 대표

27년 넘게 국악기 제작의 길을 걸어온 예혼국악기(www.yehon.kr) 김관영 대표는 한국 타악기 제작의 표준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1986년 당시 유명했던 대전의 한 공방에서 장구 만들기를 시작한 이후, 국내 유명 전통악기 제조업체인 H 국악기 공장장으로 근무했다. 전문 연주자들과 국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악기가 김관영 대표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법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접한 국악기의 매력에 빠진 날부터 27년간 악기 제작에 몰두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1998년부터 10년간 꼬박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쉰 날이라고는 다 합해 고작 30일도 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렇듯 국악기에 빠져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않은 까닭인지, 김 대표는 2009년 와병으로 1년이 넘는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다.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 경기도 양평에 예혼국악기를 설립하고, 악기의 표준과 제대로 된 악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주문 장구만을 직접 제작하고 있지만, 김 대표는 지난 25년간 10만대 이상의 장구를 직접 제작하여 전문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등 사물·풍물놀이, 장단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보급해 왔다. 그만큼 국악기 중 장구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강하다.
예혼국악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구들은 직접 가르친 제자들에 의해 제작되고 나무의 상태와 가죽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어 설명서를 보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장구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사물용과 장단용, 굿 장구와 무용 장구, 산조용과 정악용, 경고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김 대표는 "장구를 제대로 알고 권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격대에 맞춰 공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규격도 장구 피의 구성도 엉망인 경우가 많아 제작자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예혼국악기는 악기 가죽에 관심이 많다. H 국악기 재직 당시 한국 피혁연구소와 2년간의 악기 가죽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죽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장구와 북은 혁부에 속하는 악기로 장구, 북의 규격에 맞는 가죽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표면이 깨끗한 가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리의 울림에 맞는 가죽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죽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혼국악기의 또 다른 강점은 국악기 업체로서는 드물게 건축물 단청 기술을 보유한 단청가가 대북(절북) 단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제대로 된 단청 악기를 만들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모든 소품에 우리의 단청을 아로새겨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선보인 난타북 받침대 단청도 그 중 하나이며, 서울올림픽회관에 전시된 대북 단청도 예혼국악기 단청가의 작품이다. 이외에도 많은 절북과 무용북 뿐만 아니라 건축물 단청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단청의 핵심은 고급 단청 안료와 이치에 맞는 배합에 있다. 이는 예혼국악기가 변치 않고 지켜가는 원칙 중 하나로 단청의 아름다움과 국악기의 접목을 통해 수준 높은 국악기의 가치를 표현하려 하고 있다.
예혼국악기는 2011년 설립 이래 지켜오는 이념이 있다. 김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장애로 고생했던 과거의 기억과 투병 중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아픈 기억으로, '나눔', '함께', '행복'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이는 자연스레 예혼국악기의 이념으로 이어졌다. 예혼국악기의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 수익의 2~5%는 아동복지와 장애 복지 기금으로 기부되고 있다. 또한, 옥션과 지마켓 등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도 아동복지를 위하여 원천 징수, 기부되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국악기를 통하여 소통하고, 나눔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혼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의 음악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책임질 꿈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고 싶다"며, "제대로 된 악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예인들이 우리의 악기 제작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서 장구와 북, 가야금과 대금이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택민PD xa112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