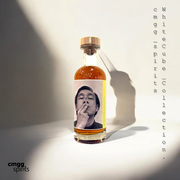입력 : 2015.09.10 17:55

11일부터 학고재갤러리서 '불계공졸 불각의 시공전'
추사의 글씨와 우성의 조각에서 '법고창신' 재조명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또 100년 후 세 사람은 통했다. 그리고 의기투합했다.
미술관과 상업화랑, 그리고 서예전문 큐레이터가 뭉쳐 불계공졸(不計工拙·기교의 능함과 서투름을 따지지 않음)과 불각(不刻)의 시공(時空)’전을 만들어냈다. 미술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의 추상조각은 그의 글씨에서 나왔다"(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추사 서예의 단단한 획을 보는 것 같다"(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진정한 전통의 창조는 껍데기가 아니라 정신이 통하는 것이다"(이동국 서예박물관 큐레이터)
이들 세명은 추사 김정희와 우성 김종영의 작품을 세기를 이어 계승되고 있는 '한국문화 뿌리'로 재조명한다.
학고재갤러리에서 11일부터 여는 '추사 김정희-우성 김종영'전이다. 지난 2010년 학고재에서 열린 '춘추' 전시의 연장이기도 하다.
김정희(1786-1856)는 ‘추사체(秋史體)’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글씨와 ‘세한도(歲寒圖)’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로 대표되는 그림에 이르기까지 학자와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조선시대 인물이다.
우성 김종영(1915-1982)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이자 교육자로서 한국 현대조각사에 가장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다.
이번 전시는 추사와 우성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슈다.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간의 접점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전시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사는 19세기 서(書)의 거장이고, 우성은 20세기 조각(彫刻)의 거장이다.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추사와 매사 깊은 침묵(沈黙)과 관조(觀照)로 일관해온 우성은 성격적으로도 반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계공졸’과 ‘불각’의 미를 찾아 동서와 고금을 주유하며 일생을 보낸 수도자다.
김정희는 글씨의 근본을, 집요한 서적(書跡)추궁 끝에 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예 '서한예서'에서 찾아냈다. 고예는 고졸한 ‘불계공졸’의 미의 덩어리다. 김정희는 왕법 중심의 종래 글씨(첩학)를 섭렵하고, 왕희지 이전으로 돌아가 고예까지(비학)하나로 녹여냈다.
김종영은 조각의 근본을 사물의 질서를 환원시켜낸 추상에서 찾아냈다. 우성은 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때에 “나는 일찍이 주로 인체에 제한되어 있는 조각의 모티브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져왔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의 모색과 방황 끝에 추상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내가 갖고 있던 숙제가 다소 풀리는 듯하였다. 참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과의 조화 같은 문제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 술회한바 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우성 김종영은 김종영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기념전이 열렸다.
둘의 행보는 닮아있다. 김정희는 중국 서예, 김종영은 서구 미술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미와 정신을 담아 재해석,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공통점이 있다.
김정희는 24세에 옹방강(1733~1818)이나 완원(1764~1849) 등 당시 중국 주요 문인들과 사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꿈에서 보고 싶어하는 인물로 꼽았으며, 김종영은 1953년, 허버트 리드가 주관하여 런던 ‘테이트갤러리’에서 개최된 '무명정치수를 위한 모뉴멘트' 국제공모전에 출품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공모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이번 전시를 여는 직접적인 계기는 우성 각(刻)의 근저에 추사 서(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국 큐레이터는 "정확히 말하면 ‘복합성(複合性)’을 띠고 있는 우성의 추상조각(抽象彫刻)에 비(碑) 첩(帖)과 각체(各體)가 ‘혼융(混融)’ 된 추사 서(書)의 원리가 배태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김정희와 김종영의 작품은 모두 '구조의 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큐레이터는 "추사와 우성은 불계공졸(不計工拙)과 불각(不刻)의 예술정신과 철학을 화면과 입체라는 2, 3차원의 시공간에서 경영해낸 작가"라고 분석했다.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은 "우성은 그냥 추상조각가가 아니다. 우성 예술의 이념적 토대 또한 서구 일변도가 아니라 서구와 현대를 관통하는 동양정신이 중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추사의 서(書)가운데 해서와 행서의 파격은 우성의 각(刻)의 미감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추사가 살아생전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더불어 김종영의 드로잉과 서예 등을 함께 선보여 두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인다.
학고재갤러리 우찬규 대표는 "단색화를 통해 한국 미술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조형성의 뿌리가 되는 서예를 화두로 한 이번 전시는 '옛것을 배워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을 가진 학고재의 이념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전시작품은 미술관과 컬렉터에서 빌려온 30여 점이 선보인다. 추사의 '자신불(自身佛)' '순로향(蓴鱸鄕)' '우향각(芋香閣)' '노규황량사(露葵黃粱社)'등이 걸려있고. 우성의 작품은 '자화상'1점과 추상조각인 '작품78-28', '작품78-31'등 절대 추상의 나무나 돌조각이 전시된다.
'예술인 것도 아닌 것도 없는 시대', 추사의 ‘불계공졸’과 우성의 ‘불각'의 미를 통해 ‘예술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인가’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다. 02-739-4937
추사의 글씨와 우성의 조각에서 '법고창신' 재조명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또 100년 후 세 사람은 통했다. 그리고 의기투합했다.
미술관과 상업화랑, 그리고 서예전문 큐레이터가 뭉쳐 불계공졸(不計工拙·기교의 능함과 서투름을 따지지 않음)과 불각(不刻)의 시공(時空)’전을 만들어냈다. 미술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의 추상조각은 그의 글씨에서 나왔다"(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추사 서예의 단단한 획을 보는 것 같다"(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진정한 전통의 창조는 껍데기가 아니라 정신이 통하는 것이다"(이동국 서예박물관 큐레이터)
이들 세명은 추사 김정희와 우성 김종영의 작품을 세기를 이어 계승되고 있는 '한국문화 뿌리'로 재조명한다.
학고재갤러리에서 11일부터 여는 '추사 김정희-우성 김종영'전이다. 지난 2010년 학고재에서 열린 '춘추' 전시의 연장이기도 하다.
김정희(1786-1856)는 ‘추사체(秋史體)’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글씨와 ‘세한도(歲寒圖)’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로 대표되는 그림에 이르기까지 학자와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조선시대 인물이다.
우성 김종영(1915-1982)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이자 교육자로서 한국 현대조각사에 가장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다.
이번 전시는 추사와 우성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슈다.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간의 접점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전시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사는 19세기 서(書)의 거장이고, 우성은 20세기 조각(彫刻)의 거장이다.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추사와 매사 깊은 침묵(沈黙)과 관조(觀照)로 일관해온 우성은 성격적으로도 반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계공졸’과 ‘불각’의 미를 찾아 동서와 고금을 주유하며 일생을 보낸 수도자다.
김정희는 글씨의 근본을, 집요한 서적(書跡)추궁 끝에 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예 '서한예서'에서 찾아냈다. 고예는 고졸한 ‘불계공졸’의 미의 덩어리다. 김정희는 왕법 중심의 종래 글씨(첩학)를 섭렵하고, 왕희지 이전으로 돌아가 고예까지(비학)하나로 녹여냈다.
김종영은 조각의 근본을 사물의 질서를 환원시켜낸 추상에서 찾아냈다. 우성은 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때에 “나는 일찍이 주로 인체에 제한되어 있는 조각의 모티브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져왔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의 모색과 방황 끝에 추상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내가 갖고 있던 숙제가 다소 풀리는 듯하였다. 참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과의 조화 같은 문제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고 술회한바 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우성 김종영은 김종영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기념전이 열렸다.
둘의 행보는 닮아있다. 김정희는 중국 서예, 김종영은 서구 미술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미와 정신을 담아 재해석,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공통점이 있다.
김정희는 24세에 옹방강(1733~1818)이나 완원(1764~1849) 등 당시 중국 주요 문인들과 사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꿈에서 보고 싶어하는 인물로 꼽았으며, 김종영은 1953년, 허버트 리드가 주관하여 런던 ‘테이트갤러리’에서 개최된 '무명정치수를 위한 모뉴멘트' 국제공모전에 출품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공모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이번 전시를 여는 직접적인 계기는 우성 각(刻)의 근저에 추사 서(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국 큐레이터는 "정확히 말하면 ‘복합성(複合性)’을 띠고 있는 우성의 추상조각(抽象彫刻)에 비(碑) 첩(帖)과 각체(各體)가 ‘혼융(混融)’ 된 추사 서(書)의 원리가 배태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김정희와 김종영의 작품은 모두 '구조의 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큐레이터는 "추사와 우성은 불계공졸(不計工拙)과 불각(不刻)의 예술정신과 철학을 화면과 입체라는 2, 3차원의 시공간에서 경영해낸 작가"라고 분석했다.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은 "우성은 그냥 추상조각가가 아니다. 우성 예술의 이념적 토대 또한 서구 일변도가 아니라 서구와 현대를 관통하는 동양정신이 중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추사의 서(書)가운데 해서와 행서의 파격은 우성의 각(刻)의 미감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추사가 살아생전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더불어 김종영의 드로잉과 서예 등을 함께 선보여 두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인다.
학고재갤러리 우찬규 대표는 "단색화를 통해 한국 미술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조형성의 뿌리가 되는 서예를 화두로 한 이번 전시는 '옛것을 배워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을 가진 학고재의 이념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전시작품은 미술관과 컬렉터에서 빌려온 30여 점이 선보인다. 추사의 '자신불(自身佛)' '순로향(蓴鱸鄕)' '우향각(芋香閣)' '노규황량사(露葵黃粱社)'등이 걸려있고. 우성의 작품은 '자화상'1점과 추상조각인 '작품78-28', '작품78-31'등 절대 추상의 나무나 돌조각이 전시된다.
'예술인 것도 아닌 것도 없는 시대', 추사의 ‘불계공졸’과 우성의 ‘불각'의 미를 통해 ‘예술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인가’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다. 02-73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