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지 않는 변화를 향한 여정
입력 : 2017.10.18 17:15
[아트 클래스] 이진우가 묻고 박서보가 답하다 2
"가짜 단색화가 너무 많아..."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

―한지의 재발견
이진우 : 한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프랑스에서 미술재료학을 연구하며 재료란 결국 자기 땅에서 나온 것을 쓸 수밖에 없단 것을 알았어요. 사실 린넨 천에 안료를 게우는 서구의 유화는 지리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전 세계에 자리 잡았어요.
반면 우리 토양에서 나온 한지가 국내에서조차 등한시되는 점은 한스럽습니다. 작가라면 내 것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하게 표현하자면 '한지에 제 그림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작가로서 이름이 나면 '이진우가 쓴 재료가 한지'라며 한지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지는 좋은 품질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거든요. 종이 거리로 유명한 베이징 유리창에서도 고려지가 최고라고 돌려보내더라고요.
박서보 : 청나라 문화 황금기인 건륭 시대에도 중국의 역사서를 쓰기 위해 수명이 긴 고려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존심 센 청나라인 조차 우리 종이를 쓸 정도로 품질이 뛰어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종이 위에 컬러를 입히면 종이에서 색이 튀어나와요. 발색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지는 양지와 달리 색을 넣으면 종이가 그것을 다 흡수해서 종이와 일체됩니다. 서양의 철학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듯 종이 위의 색도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날뛰고 발색해요.
반면 동양에서는 종이와 색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연관과 한지는 가장 잘 맞는 매체입니다. 결정적으로 한지를 쓰겠다고 생각한 일은 석굴암 해체 복원 당시, 1 천년 된 종이가 나왔을 때예요. 그렇게 오랜 역사와 견고함이 한지의 매력이죠.

―쓰기와 그리기에 대하여
이진우 : ‘한국적’이라는 것은 작업에 자연히 베어 나와요. 저는 작업실에 가면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서예를 씁니다. 쓰는 행위는 그림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서보 선생님의 작업은 작업 자체가 그리기이자 또 쓰기이시죠?
박서보 : 묘법 시리즈가 그렇겠지요. 개인적으로 ‘묘법’을 'Ecriture'로 번역한 것이 지금까지 못내 아쉬워요. ‘묘법’이란 고유명사 그대로 붙여야 했어요.
프랑스 유학 당시 기호학, 구조주의의 주요 용어인 ‘Ecriture’가 서양 사람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LA의 유명 판화전문 화랑 믹소그라피아(Mixography gallery)에서 전시를 할 때였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전시 엽서에 ‘서보 박’이라 사인을 해 제작한 것을 발견하고 2천 달러를 들여 재인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50년대부터 모든 작품에 ‘박서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백남준이 죽기 전에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귀국하면 제일 먼저 만나고픈 사람으로 저를 들었다더군요. 백남준은 ‘남준 백’이라고 작품 사인을 했죠. 이후에 들었는데 ‘백남준’이라 하지 않은 것이 일생의 잘못으로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세계미술시장에서 김창열, 이우환 등 미술가의 이름을 우리식 고유명사로 사용해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 저 역시 영어로 ‘이진우’라고 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사람들 중 ‘무슈 우’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요. 한국에서는 성을 먼저 쓴다는 것을 알려주면 될 일이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그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박서보 :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는 자세는 작가란 직업뿐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중요합니다. 자신을 객관화·대상화해 바라보면 타인이 지루하지 않을 단계에서 멈추고 포기합니다. 저는 최근 ‘지그재그 시리즈’ 중 컬러 작업을 중단하기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나아갈 수 있는 작업이지만 아쉬움을 가질 때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전 ‘지그재그 시리즈’는 큰 종이에 물을 축여 그렸어요. 이제는 조그만 종이를 계속 이어가면서 붙이는데 그 종이와 종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신적 깊이를 더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화하면 추락한다." 말 그대로입니다. 변화하면서 추락하지 않으려면 나를 객관화하고 냉정히 비판해야 합니다. 박수받을 때가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럴수록 매몰차게 바라봐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성격이 저를 자빠뜨리지 않도록 했어요. 변화의 과정을 남에게 보이기 전에 혼자 4~5년을 시도해보며 내 신체의 부분, 행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시에 대작을 들고 나왔어요. 좋은 술은 숙성기간 길죠. 박수 받고 싶어서 성급하게 개념만 변하면 추락해요.
이진우 : 근래 파리에서 전시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다른 예술가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서양 중심 현대미술에 지쳐간다는 겁니다. 예술가는 생명의 존재를 다루는 사람들이니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죠. 선생님 말씀대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의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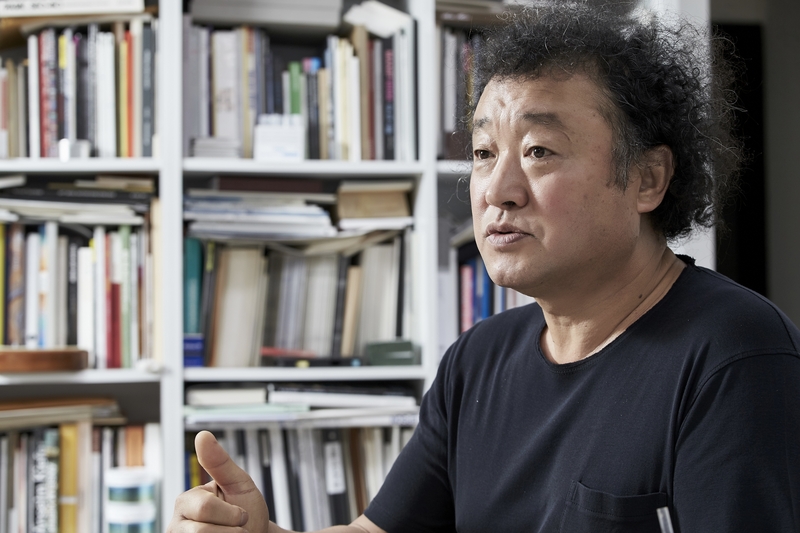
―단색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박서보 : 단색화에 대해 한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가짜 단색화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 단색화로 불리기 어려운 것이 ‘단색화’라는 타이틀로 퍼지고 있습니다.
단색화의 중요 요체는 1)행위의 무목적성, 2)반복성, 3)그러면서 화면에 생기는 물성, 4)거기에 정신. 이 네 가지 요체가 합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 그 몸짓의 흔적이 단색화입니다. 단색을 쓰거나, 희끄무레하다고 다 단색화라고 보면 안 돼요. 단색화와 가짜 단색화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작가를 본 적이 없어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열린 <단색화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단색화의 4대 요소를 정리해서 말했어요. 그때 이우환 작가가 어느 비평가도 이렇게 명료하게 단색화를 규정한 사람이 없다며 반가워하더라고요. ‘단색화’라는 단어를 세계에 알린 학자 조앤 기에게도 ‘단색화’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색이 아니라 사상의 문제거든요. 서양은 자연과 인간이 이원화 되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즉 자연의 부분’임으로 절대 분리 하지 않아요. 자연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며 자연에 살기 바란다는 생각이 근대화과정에서 마치 미신처럼 취급되며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중심 상실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형편없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시 자연관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 한 것이죠. 저는 1970년대부터 자연관의 회복 운동을 말하고 다녔어요. 서양의 모노크롬은 다색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단색화’는 다색조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을 가장 순수하게 거역하지 않는 삶을 색에 최소 표현으로 드러낸 거죠. 서양의 모노크롬으로는 단색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단색화를 시장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계미술의 한 흐름과 내가 어떻게 다르냐가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