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대신 문화 채워… 산업화 유산 41년만에 재탄생
입력 : 2017.10.13 01:38
[전시·공연장 된 마포 석유비축기지, 내일 정식 개장]
석유 파동 겪은 후 탱크 건설, 서울 시민 한 달간 쓸 석유 저장
2000년 폐쇄… 버려진 땅으로… 외관은 그대로, 내부를 새 단장
"박 시장, 거기 가보셨나? 거기 참 괜찮은 곳인데."
2012년 9월 고건 전 총리가 우연히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런 귀띔을 했다. 고 전 총리는 "과학관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흐지부지됐다.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두긴 아깝다"고 말했다. 곧바로 고 전 총리와 현장을 찾아간 박 시장은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했다.

고 전 시장이 추천한 장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석유비축기지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국내 경기가 출렁이자 정부에서 매봉산 자락 14만㎡ 일대에 높이 15m, 지름 15~38m인 탱크 5개를 세우고 서울 시민이 한 달간 쓸 석유(6907만L)를 저장해뒀다. 기지는 완공되던 1978년부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1급 보안시설로 관리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짓게 되자 경기장 서쪽에 있는 기지가 위험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2000년 11월 기지를 폐쇄했다. 비축됐던 석유는 경기도의 저장소로 옮겨가고, 축구장 20개 면적의 넓은 부지는 관광버스나 드나드는 주차장이 됐다.
◇되살아난 산업화 시대 유산
이후 버려지다시피 했던 땅이 41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달 1일 기지의 외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단장해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변신한 옛 석유비축기지의 모습이 공개됐다. 2014년 서울시가 이곳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 만이었다. 석유 대신 문화가 가득 차는 곳이라는 뜻에서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원래 있던 탱크 5개 외에 새 탱크 1개가 들어섰다. 기지 한가운데 있는 문화마당(3만5221㎡)을 탱크 6개가 둘러싼 모양새다.
2014년 9월 착공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원형을 살려야 하는데 1978년 준공 당시 설계도를 찾을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들은 탱크 주변 옹벽과 흙을 조금씩 파내 땅속에 묻힌 원형을 추측해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추측으로 만들다 보니 설계가 수시로 변경돼 진땀을 뺐다. 5개월 만인 2015년 1월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기록물보관소에서 설계도가 발견됐다. 시 직원들은 "하늘이 돕는다"며 감격했다.
저장고 내외장재와 옹벽, 공사 중 발견된 돌덩이를 버리지 않고 건축에 활용했다. 석유저장고를 지탱하던 철판을 잘라 공연장 안전 손잡이로 만들고, 4번 탱크 지하에 있던 커다란 돌들은 3번 탱크를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세웠다. 3번 탱크는 조성 당시 모습을 간직하도록 예전에 쓰던 송유관 점검용 철사다리 등을 그대로 뒀다. 시는 예산 470억여원을 들였다.
◇"한국의 테이트 모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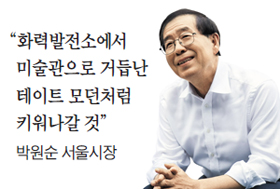
산업화 시대 유산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문화비축기지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거듭난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가스공장에서 공동주택으로 변신한 오스트리아 빈의 가소메터(Gasometer) 시티와 닮았다. 지난 10일 기지를 찾아가보니 새로 만든 6번 탱크가 입구 초입에서 시민을 맞고 있었다. 여러 탱크 내부는 불과 10여년 전까지 석유로 가득 찼던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끔했다. 초청 작가들이 설치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14일엔 각 전시장·공연장에 들어갈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개원식이 열린다. 클래식 콘서트, 무용, 서커스 등 공연이 이어지고 야시장이 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해 문화비축기지를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