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은 덜 완벽해 인공적인 宮에서 더 발랄"
입력 : 2014.06.16 01:32
작가 이우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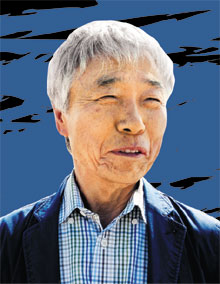
"짐이 곧 국가"라고 외친 '태양왕' 루이 14세는 자연 위에도 군림하려 했다. 무모해 보였던 이 야망은 천재 조경가 앙드레 르 노트르(1613~1700)를 만나 실현됐다. 르 노트르는 왕의 시점에서 광활한 자연이 수렴되도록, 왕이 사는 창문을 소실점으로 해서 완벽한 좌우대칭 정원을 설계했다. 인공적으로 완벽히 통제된 자연, 그것이 이우환〈사진〉의 전시장이 된 베르사유궁 정원이다.
"1973년 베르사유궁을 처음 봤다. 원통, 직육면체 모양으로 매끈하게 다듬어 놓은 나무들을 보니 대단하더라. 그런데 그 인공적인 완벽함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됐다." 작가 인생 최고의 날, 이우환은 부르튼 입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내 작품은 덜 완벽하고 자연성이 강해 동양 정원에선 묻혀서 작품처럼 안 보인다. 오히려 철저히 다듬어진 인위적인 공간에서 더 발랄하게 보인다. 그래서 베르사유궁이 내겐 '왓따'(최고)였다."
이우환은 르 노트르가 '내가 완전무결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만 같았다고 했다. 그의 해법은 이미 완벽한 상황에서 최소의 장치만을 제시해 가려져 있던 무한감, 자연감, 우주감을 살리는 방식이었다. '완벽을 넘어서는 방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예컨대 20여년 전 일본 시골길에서 무지개를 봤을 때의 기억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관계항―베르사유의 아치'는 '공간을 지나는 무대'로 상정했다. "설치물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하늘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다.
전시를 준비하며 이우환은 베르사유궁을 50번 넘게 왔다. "나는 책상 위에 앉아 이미지를 끌어내지 않는다. 작품이 놓이는 곳의 역사·공간과 대화하고, 간단한 설치로 공간이 스스로 얘기하게 열어 준다. 이게 내가 주창한 모노하(物派)의 핵심이다."
이우환은 매번 전시에 쓸 돌을 찾아다닌다. 이번엔 알프스의 몬테로사 중턱에서 가져온 돌과 독일 돌집에서 가져온 스칸디나비아 돌을 썼다. 전시가 끝나면 늘 돌을 자연에 돌려놨다. "슬슬 적당히 버릴 데를 찾아봐야겠네." 쏟아지는 인터뷰에 핑거푸드 하나 들고 허기를 채우던 이우환이 웃었다.
"1973년 베르사유궁을 처음 봤다. 원통, 직육면체 모양으로 매끈하게 다듬어 놓은 나무들을 보니 대단하더라. 그런데 그 인공적인 완벽함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됐다." 작가 인생 최고의 날, 이우환은 부르튼 입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내 작품은 덜 완벽하고 자연성이 강해 동양 정원에선 묻혀서 작품처럼 안 보인다. 오히려 철저히 다듬어진 인위적인 공간에서 더 발랄하게 보인다. 그래서 베르사유궁이 내겐 '왓따'(최고)였다."
이우환은 르 노트르가 '내가 완전무결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만 같았다고 했다. 그의 해법은 이미 완벽한 상황에서 최소의 장치만을 제시해 가려져 있던 무한감, 자연감, 우주감을 살리는 방식이었다. '완벽을 넘어서는 방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예컨대 20여년 전 일본 시골길에서 무지개를 봤을 때의 기억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관계항―베르사유의 아치'는 '공간을 지나는 무대'로 상정했다. "설치물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하늘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다.
전시를 준비하며 이우환은 베르사유궁을 50번 넘게 왔다. "나는 책상 위에 앉아 이미지를 끌어내지 않는다. 작품이 놓이는 곳의 역사·공간과 대화하고, 간단한 설치로 공간이 스스로 얘기하게 열어 준다. 이게 내가 주창한 모노하(物派)의 핵심이다."
이우환은 매번 전시에 쓸 돌을 찾아다닌다. 이번엔 알프스의 몬테로사 중턱에서 가져온 돌과 독일 돌집에서 가져온 스칸디나비아 돌을 썼다. 전시가 끝나면 늘 돌을 자연에 돌려놨다. "슬슬 적당히 버릴 데를 찾아봐야겠네." 쏟아지는 인터뷰에 핑거푸드 하나 들고 허기를 채우던 이우환이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