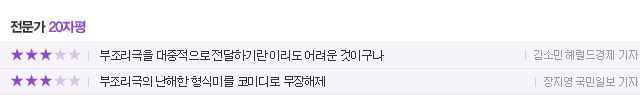그 어려운 대사, 그래서? - 연극 ‘대머리 여가수’
입력 : 2011.01.21 16:52

[이브닝신문/OSEN=오현주 기자] 서씨와 서씨 부인이 거실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씨는 골프 스윙을 연습하다 신문을 뒤적이고 부인은 조금 전 끝낸 저녁식사의 메뉴였던 고등어구이와 김치찜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두 사람은 가끔 말을 섞기도 하는데 알 듯 모를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한 건 군인이야.” “왜요?” “공무원이잖아.” 이들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어떤 대답이 나오든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묘하게 연결된다. 장면과 장면에도 분명한 고리가 있다. ‘연극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받았던 부조리극의 대표작이 국내 무대에 첫 선을 뵈고 있다. 이해가 어려운 문제를 엉뚱한 코미디로 채운 연극 ‘대머리 여가수’다.
한 여자와 남자가 서씨 부부의 집에 들른다. 그다지 튀어 보이지는 않는다. 처음 본 사이인 듯 어색한 표정을 짓던 이들은 잠시 후 서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추적을 시작한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5년 전 같은 날 전주로 이사를 했으며 고양시 아뜨빌라 608호에 사는 공통점이 있었다. 결국 침구 색깔이 같은 것은 물론 빨강머리에 한쪽 눈만 쌍꺼풀이 있는 딸이 하나 있다는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보고나서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한다. 마씨 부부였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챌 수 있다. 연극 ‘대머리 여가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다. 쏟아내는 말들은 상대와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옥죄었던 말을 풀어헤치기 위해서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합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현대연극사를 다시 쓰게 하며 부조리극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루마니아 출신 외젠 이오네스코(1909∼1994)가 쓴 첫 희곡을 무대에 올렸다. 1950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했고 60년간 유럽 극장에서 쉼 없이 소개됐다. 국내에선 이번 공연이 처음이다. 영국 중산층의 스미스 부부와 마틴 부부는 한국 중산층의 서씨 부부와 마씨 부부로 대체돼 지극히 한국적인 언어유희를 풀어놓는다.
부조리는 무대 위 일상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런 식이다. 현관 문 밖에서 벨이 울린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 다시 벨이 울린다. 역시 아무도 없다. 그러자 거실에선 논쟁이 시작된다. “벨소리가 난다는 건 밖에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벨이 울린 후 등장한 소방대장이 결론을 내준다. “어떤 때는 누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없어.”
논리가 정연하고 아귀가 잘 맞아야 하는 연극문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정확히 의미전달이 안 되는 대사의 나열, 석연치 않은 구성, 납득이 되지 않는 돌발상황을 만들어내며 일상적인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오히려 생경한 것처럼 몰아간다. 극 안에선 정상보단 비정상이 우월하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대머리 여가수는 대화 속에 단 한 번 등장한다. 퇴장하던 소방대장이 묻는다. “그런데 대머리 여가수는?” 서씨 부인이 답한다. “늘 같은 머리 스타일이죠.” 배우 안석환의 첫 연출작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소방대장 역으로도 등장해 번안·연출·출연까지 1인3역을 해낸다. 서울 동숭동 대학로 SM아트홀에서 3월31일까지 모호한 대화를 이어가며 현대인의 부조리한 자화상을 찾아간다.
euanoh@ieve.kr /osenlife@osen.co.kr
- Copyrights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