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아시아프 개막] [내가 본 아시아프] 누가 飛龍이 될 것인가
입력 : 2010.07.29 03:05
[내가 본 아시아프] 화가 사석원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를 빠져나오자 햇살이 얼굴을 찌른다. 눈이 부셔 아롱거리는 풍경 속에서도 줄지어 늘어서 나부끼는 깃발들이 인상적이다. 〈2010 아시아프(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를 알리는 배너였다.
27년 전인 1983년 나는 성신여대에서 후원한 전국대학미전 수상을 위해 이곳에 온 적이 있다.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 첫발이었다. 이번에 이곳에서 열리는 성대한 미술축제에 참가한 777명의 젊은이에게도 오늘은 작가로서 중요한 기념비가 되리라.
27년 전인 1983년 나는 성신여대에서 후원한 전국대학미전 수상을 위해 이곳에 온 적이 있다.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 첫발이었다. 이번에 이곳에서 열리는 성대한 미술축제에 참가한 777명의 젊은이에게도 오늘은 작가로서 중요한 기념비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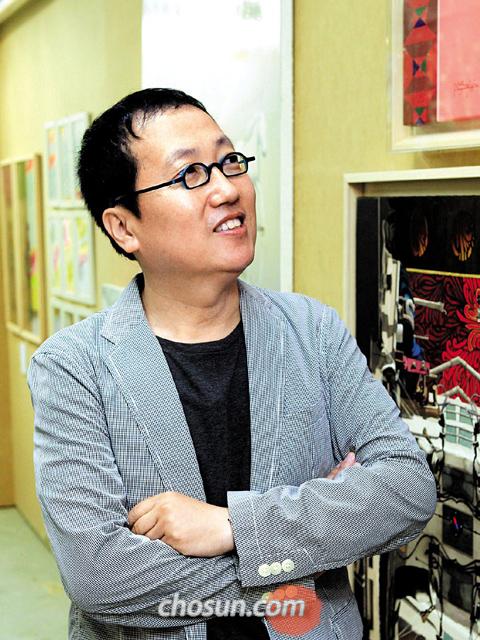
미술대학 건물을 개조한 아시아프 전시장은 사람들의 열기로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그들은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즈 같았다. 그렇다! 붉은 티셔츠를 입진 않았지만 '문화 서포터즈'로 넘쳐나는 축제의 무대가 분명했다.
전시장은 서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참여 작가들의 설렘과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다는 교훈을 그들은 아마 난생처음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작품 경향은 아주 개인적인 자신만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다. 회화는 특정 사조나 유행에서 비교적 벗어나 보였다. 재기와 발랄함이 돋보였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내 시선은 영상과 입체조형물에 끌렸다. 실험적이고 신선한 작품들이 많았다. '대담한 시도와 세련된 형식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감탄했다. 한국 미술의 힘이 느껴졌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드문 기회답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 받았다. 일종의 국제문화경연장이었다. 마치 아시아의 수많은 작은 용(龍)들이 푸른 하늘을 향해 먼저 날기 위해 경쟁하는 듯 보였다. 아직은 맘껏 날 수 있는 용다운 용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쩌렁쩌렁 용트림하며 먹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비룡(飛龍)같은 대가가 출현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됐다.
중국 작품은 중국다웠고 일본 작품은 일본다웠고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대만·태국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자유로운 발상과 개성이 돋보였고 충만한 에너지가 강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역사적 혹은 문화적 DNA라고 할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재하여 온 독특한 조형세계가 부족해 보였다. 다양한 기법과 주제가 혼용되어서 뚜렷이 어느 것이 한국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뒤섞인 비빔밥 같았다. 그것이 한국 미술의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진다.
피카소나 이중섭, 박수근, 백남준 같은 용 중의 용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광기와 반성을 먹이로 해서 성장했다. 또한 미래의 대가들은 그것에 덧붙여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다. 붉은 악마를 뛰어넘는 문화 서포터즈의 역할을 〈아시아프〉가 책임감 있게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더욱더 뜨거워질 내년의 〈아시아프〉가 벌써 기대된다.
전시장은 서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참여 작가들의 설렘과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하다는 교훈을 그들은 아마 난생처음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작품 경향은 아주 개인적인 자신만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다. 회화는 특정 사조나 유행에서 비교적 벗어나 보였다. 재기와 발랄함이 돋보였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내 시선은 영상과 입체조형물에 끌렸다. 실험적이고 신선한 작품들이 많았다. '대담한 시도와 세련된 형식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감탄했다. 한국 미술의 힘이 느껴졌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드문 기회답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 받았다. 일종의 국제문화경연장이었다. 마치 아시아의 수많은 작은 용(龍)들이 푸른 하늘을 향해 먼저 날기 위해 경쟁하는 듯 보였다. 아직은 맘껏 날 수 있는 용다운 용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쩌렁쩌렁 용트림하며 먹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비룡(飛龍)같은 대가가 출현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됐다.
중국 작품은 중국다웠고 일본 작품은 일본다웠고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대만·태국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자유로운 발상과 개성이 돋보였고 충만한 에너지가 강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역사적 혹은 문화적 DNA라고 할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재하여 온 독특한 조형세계가 부족해 보였다. 다양한 기법과 주제가 혼용되어서 뚜렷이 어느 것이 한국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뒤섞인 비빔밥 같았다. 그것이 한국 미술의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진다.
피카소나 이중섭, 박수근, 백남준 같은 용 중의 용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광기와 반성을 먹이로 해서 성장했다. 또한 미래의 대가들은 그것에 덧붙여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이다. 붉은 악마를 뛰어넘는 문화 서포터즈의 역할을 〈아시아프〉가 책임감 있게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더욱더 뜨거워질 내년의 〈아시아프〉가 벌써 기대된다.
